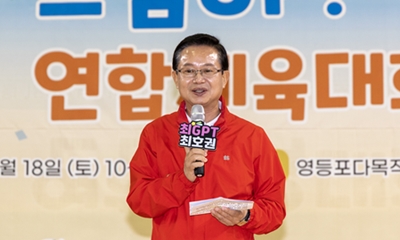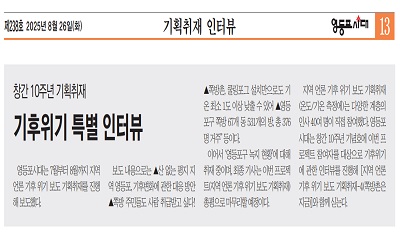|
“AI 발전의 속도와 효율성 높이려는 다층 전개 중”
작금의 AI는 주로 새로운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로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후 데이터의 패턴과 구조를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기존 데이터와 유사하나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인간의 창의적 활동 영역을 모방한 AI이다.
AI 파워는 축적된 일상 데이터의 양, 이의 수집/저장/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제도 환경, AI 알고리즘을 개발/선도하는 능력, AI 학습 추론에 필수적인 고성능 AI 반도체와 이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AI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최고급 인력의 배출 또는 유치할 교육/연구 환경, 정부/민간의 대규모 R&D 투자 등으로 가늠한다. 이에 따른 AI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불행히도 모든 국가 위에 군림하는 패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타의 국가가 이를 따라잡고 나아가 필적할 AI 파워를 갖추기는 이미 늦었음이 자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미래를 포기할 수 없는바 그 대응책으로 ‘소버린 AI(Sovereign AI)’의 구축을 논한다. 소버린 AI는 한 국가(또는 기업)가 자체 인프라/데이터/인력/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I 모델의 개발 및 운용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다. 자국 내에 AI 연구소/데이터센터/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등을 구축한 기술적 독립성으로 타국의 기술과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 자국 문화/언어/법률/정책에 최적화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 방안이다. 그러나 이 소버린 AI의 구축 또한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수반됨에 이에 자원 공유와 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연합이 모색되어 EU와 일부 아랍권이 각각 추진 중이다. 소버린 AI라 하여 반드시 폐쇄적 자국 중심 개발만이 아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되 국제 공조를 통해 AI 발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다층 전개 중이다. 우리나라도 그 한 방안으로 지난 9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에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저장 프로젝트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아시아의 ‘AI 수도’로 육성하는 전략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기 AI 선두 주자이자 ChatGPT 제공사인 오픈AI도 우리 정부와 MOU를 체결해 ‘AI 동맹’을 본격화했다. 한편, AI 인프라 구축에 절대적인 GPU(그래픽 처리장치)의 독점 공급으로 제국을 만든 엔비디아에 최근 AMD를 선두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이 도전 중인 가운데 삼성과 SK는 HBM(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을 공급하며 이 패권 판도에 상당 영향을 미치고 있고, GPU를 대체할 NPU(신경망 처리장치)를 상용화 중이기도 하다. 이런 메모리/AI 가속 칩 기술력 기반하에, 울산을 시작으로 속속 들어설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이에 소요될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AI 알고리즘의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의 확보 등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소버린 AI 연합으로 서둘러 이뤄낸다면 패권적 두 초강대국 주도 세계 정세에 대한민국이 제3의 축이 될 수 있다.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AI의 양면성을 강조한바, AI는 인류 번영을 이끌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통제 없이 끌려간다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실리콘 장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유일하고 현명한 대처라면서 국제 규범의 마련을 촉구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게 한국이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렇다. 치닫는 AI 패권주의가 종국엔 인류의 미래를 파탄 낼 개연성이 적지 않음이 예견되는 지금, K-컬처 신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이 앞장서 K-외국과 함께 혼문(魂門)으로의 소버린 K-AI를 구축해 ‘케데헌’의 헌트릭스가 되어 인류를 위한 뉴노멀을 주도하자!
박무 전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